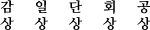2019. 2. 12. 02:49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쓰는 게 옳을까.
몇 천 자가 넘는 글을 썼다. 다 모은다면 팔천 자가 조금 넘을 것이다.
몇 번씩 심장이 두근거렸다. 좋은 징조였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다. 배불리. 좋은 것을. 먹는다.
읽으려고 하던 책들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반성한다.
보려던 시리즈들을 묵혀두느라 회차가 밀린다. 반성까지는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다지 춥지도 않던 올해의 겨울은 외려 2월이 되니 점차로 서늘해진다.
아닌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니 날씨에 관한 내 감상은 불확실하다.
몇 곡의 노래를 익혔다. 좋아하는 가수이고, 날이 갈수록 마음이 깊어진다.
재수 없는 사람, 비격식체로는 재수 없는 새끼들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증오한다. 요새도 그렇다.
가끔씩 무언가를 했고 자주 무엇도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탓에 피로해진다.
나는 왜 내 일상에 강박을 가지는가?
하려던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이 역시 반성하고 있다.
알던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반성해야 할까. 모르겠다.
오늘 9년 간 쓰던 휴대전화의 번호를 바꾸려 한다. 좋은 징조일까.
어떤 순간에는 아주 신이 나고 어떤 순간들에는 대개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은 또 어떤 맛인가.
하려던 일들… 숱한 계획들… 머리가 아프다.
쓴 것을 보니 신경이 대단히 과민한 사람의 회고록 같이 느껴진다. 혹은 그런 척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정말 그런가?
2월 12일 새벽 2시에 이 글을 쓴다.
숫자 2를 좋아한다. 적어도 이것만은 진실이다.
졸음이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