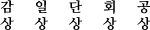2019. 1. 19. 02:44
멋지게 잘 짜여진 소설. 문장들이 담백하고 단정한데, (특히 1부에서) 자꾸만 가슴을 쿵쿵 치는 지점들이 있다. 각 부마다 화자가 다른데 화자 뿐 아니라 소설 자체의 결이 다른 것도 참 재밌다. 애틋한 첫사랑을 담은 미완성 연애소설 같은 1부, 20대 남성의 자아찾기(글 좀 쓰겠다는 젊은 한국 남성들이 너무 사랑하는 플롯과 남성 화자라 거부감이 들기는 했으나...)라고 할 수 있는 2부, 역사적 인물 마르크스를 소재로 하여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전기 소설적 면모를 보이는 3부. 각 부에서 흩어진 단서들이 남겨진 이야기에 모여 완성되며 소설 전체의 짜임새와 설득력을 갖춘다.
3부는 전기 같기도 하고 서스펜스 같기도 하고, 댄 브라운 생각이 나는 제법 묘한 구조였는데, 실제 고증에 바탕을 둔 요소를 여럿 차용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한 것이 참 영리하고 마음에 든다. 71년생인 작가가 바라보는 80년대가 남긴 그늘들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점도 좋았다. 80년대를 서술하는 70년대생 화자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 현장 자체를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늘 큰 불만이었어서 이런 방식의 조명이 신선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제목인 <알제리의 유령들>처럼 잘 형체가 잡히지 않는 아스라한 분위기, 완벽하게 맞물리지는 않는 듯한 3부 구성도 좋지만 결국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짊어지고 싶지 않은-차마 짊어질 수 없는 운명에서 도망치는 사람이라니?너무 매혹적이고 재밌음.
여성 캐릭터들은 여성 작가 특유의 세심한 시선으로 잘 짚어냈다 싶은데 남성 캐릭터가 주변부적 인물에서 벗어나 서사의 중심으로 나타날 때는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느껴지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그리며 홀로 수음하는 장면은 2018년에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끔찍한 감이 있다.
다만 인터뷰에서 알게 된 작가의 부모에 관한 이력은 정말 TMI 그 자체였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인데 정말 대단한 이력인 양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 자체에 너무 짜증이 났으나 적어도 작가께서 글을 아주 오래, 천천히, 꾸준히 고치면서 쓰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점이 느껴져서 좋았다.
글을 몇 번씩 고쳤을까? 이런 걸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읽기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또 이마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