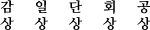2019. 8. 25. 21:16
단언하는데, 이제 한국의 여름은 윤가은의 놀이터다.
일본의 여름을 상징하는 감독이 고레에다라면 한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감독은 윤가은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달까. 아동을 다루는 심도 있는 태도도 그러하고. <우리집>-<플로리다 프로젝트>-<아무도 모른다>를 연달아 보면 여름·아동 주제의 참 좋은 한미일 삼부작 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세 영화 다 집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도 같네.
<우리들>을 너무 좋게 본 탓인지, 전작보다는 좀 덜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긴 했다. 그러다가도 <우리들> 속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될 때면 속으로 마구 마구 비명을 질렀다. 악! 악! 악! 하고.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하고.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기분이랄까. 그러고 보면 벌써 스무 살을 넘긴 나처럼 그때 그 애들도 어딘가에서 여전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보라와 지아, 선처럼.
언젠가 윤가은 감독이 선보이게 될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하나와 유미, 유진이가 풍경처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무사한 얼굴을 보게 되는 게 내겐 참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영화를 보는 내내 왜 하필 달걀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상영관을 나와서야 차츰 정리가 됐다. <데미안>의 그 유명한 구절이 생각나는 장치였던 것이겠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라는. 시종 흰자와 노른자를 섞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하나의 요리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흰자와 분리된 상태의 써니 사이드 업 타입 후라이가 된다. 노력하여 섞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걸, 하나가 깨닫게 된 탓이겠지. 달걀판을 구태여 노란색으로 칠했던 것도, 그 전까지는 달걀을 무심결에 깨뜨리고 말았지만 최후에는 달걀판을 발로 꽝꽝 차서 부수는 모습까지, 모두 그 상징의 연장선일 것이다.
하나가 달걀을 섞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화면이 페이드 아웃 된 후 하나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소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기는 아마 달걀 후라이를 깨뜨려 밥과 함께 먹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그런 식으로나마 섞였으니, 이제 관객이 보지 못할 하나의 나날들이 평화로울 거라고 기대하게 된다. 세계엔 그런 유의 화합도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에게 안녕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스크린 속 김나연 배우를 바라보는 기쁨은 고아성 배우를 처음 봤을 때의 희열과 유사하다. 좋은 배우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눈에 담아 더 오래 오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배우 참 좋다, 하고 본 어린 배우들이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지고 마는 경우들은 이제 너무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달지.
윤가은 감독이 앞으로 계속 그려낼 '우리'들의 이야기가 참 기대되고 궁금하다.